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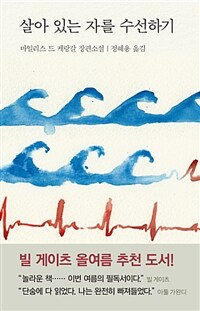
두 사람은 찰나의 순간 서로를 바라본다. 그리고 내딛는 한 걸음. 서로를 껴안는다. 무시무시한 힘의 포옹. 마치 상대방을 자기 안에 으깨어 넣기라도 하려는 것 같다. 머리통이 쪼개져라 밀착된 머리들. 가슴팍에 파묻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어깨들. 죽어라 껴안느라 고통스러운 팔들. 두 사람은 목도리, 윗도리, 외투의 회오리 속에서 뒤엉킨다. 사이클론에 맞서 암벽처럼 버티려고 부둥켜안을 때, 허공으로 몸을 날리기 전 돌처럼 굳어 끌어안을 때의 그런 포옹. 어쨌든 세상 끝 날의 그 무엇. 그 순간, 그것은 그 둘을 같은 시간, 정확하게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 접속하게 만드는 몸짓이자(입술끼리 부딪힌다) 둘 사이의 거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없애 버리는 몸짓이기도 하다. 그 둘이 서로를 풀어 줄 때, 그 둘이 마침내 서로를 놓아줄 때, 얼이 빠지고 기진맥진한 그 두 사람은 흡사 조난자들이다.
왜냐하면 시몽의 눈, 그건 그저 그 아이의 신경 망막, 그 아이의 호박단 천처럼 빛에 따라 변하는 홍채, 그 아이의 수정체 앞에 위치한 순수하게 검은 동공이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건 그 아이의 눈빛이기도 했다. 그의 피부, 그건 그저 그 아이의 표피의 그물 조직, 그 아이의 땀구멍이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건 그 아이의 빛이자 그 아이의 촉감, 그 아이의 육신에 달린 살아 있는 탐지기들이기도 했다.
그래, 그녀 역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말도 하는 법이 없었다. 숀을 사랑해서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배를 만들고 눈 아래서 불을 피우고 온갖 별과 성운의 이름을 꿰며 복잡한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부는 남자라는 그 고약한 상상의 산물에 그녀 스스로도 홀렸을테고, 자기 아들 역시 그처럼 강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경탄했을 테고, 그가 남다르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을 테다. 그렇다.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둘 다 아이를 보호할 줄을 몰랐다.
<살아 있는 자를 수선하기> 중에서.
_
소년의 죽음과, 그의 죽음이 장기이식을 통해 다른 삶이 시작되는 순간을 그렸다.
첫 번째 문단은 아이의 죽음을 전해들은 부모가 서로를 포옹하는 순간이다.
"상대방을 자기 안에 으깨어 넣기라도 하려는 것 같다." 꺽꺽대는 울음, 혹은 하얗게 텅빈 머리로 뱉어 지지 않는 말들 대신 몸의 언어로 슬픔을 풀어낸다. 많은 소설이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 말하려 했다면 이 소설은 그 순간 '몸'은 어떤 말을 하는지 적어냈다.
'이후의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은 피부, 하얀 가면-프란츠 파농 (0) | 2018.08.15 |
|---|---|
| 점심이 지나서 (0) | 2018.08.10 |
|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흰 윤리-경애의 마음 (0) | 2018.07.22 |
| 주말의 공사 (0) | 2018.07.21 |
| 슬픈 엉덩이 (0) | 2018.07.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김소연
-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
- 민구
- 일상
- 네모
- 이준규
- 진은영
- 열린책들
- 배구
- 서해문집
- 후마니타스
- 뮤지컬
- 피터 판과 친구들
- 지킬앤하이드
- 상견니
- 한강
- 문태준
- 궁리
- 이병률
- 이영주
- 차가운 사탕들
- 이장욱
- 책리뷰
- 대만
- 희지의 세계
- 현대문학
- 이문재
- 나는 사회인으로 산다
- 정읍
- 1월의 산책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