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베껴 슨 이야기에 소리를 불어넣고
뜻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녹취록」부분
기다림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제 '기다리는' 나
무능하게도 기다림은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나'만을 동그랗게 놓는다. 나의 기다림이 그 장소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나'이기 때문이다. 그녀와 약속한다고 해서 기다림이 그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그녀의 기다림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마치 약속 모두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나의 기다림과 다른 이의 기다림을 같은 것으로 놓는 오류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행위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약속한다.
이 시집에서 화자는 기다리고 있다. 흔히 기다리는 '대상'을 기다림의 최후에 놓고 말하지만, 화자는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 쓰지 않는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대상의 높고도 중요한 존재 때문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라는 사건에서 만날 나의 어떤 순간을 비로소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중에 탄생한 말들, 화자의 이지러짐을 따라가야 한다.
syzygy, 인간에게 없던 말을 인간의 세계로 가져오다
제목부터 보자. 'syzygy'라는 단어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있다.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있는 순간이라는 뜻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상상할 수 있을까. 이들이 한 날 한 시 일직선상에 만나자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 순간은 저마다의 지금을 오랫동안 움직여 이뤄낸 결과다. 그런데 해의 뒤에 달이, 달의 뒤에 놓인 지구를 따라가다보면 이 만남의 끝에는 지구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로 하늘을 올려다 본 인간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얼굴을 생각하면 슬퍼진다. 그 얼굴은 달과 지구와 태양의 움직임을 알았을 이다.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외로웠을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저지라는 때가 언젠가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을 인간이기 때문이다. 'syzygy'를 탄생시킨 것은, 지구 밖의 움직임을 알리고 받아들이게 한 외로운 인간들이 만든 신화의 조각이다.
그렇다면 시인의 'syzygy'는 무엇일까. 오도커니 앉아서 테이블의 모서리를 만진다. 실물을 만지고 있는 사이, 테이블은 투명해지고 '나'는 생각에 잠긴다. 실제의 자리가 생각의 모서리로 바뀌고 '나'는 이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혼자있는 순간을 만들어 들어간다. '내가 만지작거린 건 생각의 모서리였을까./ 미물의 더듬이였을까.// 아니면 그저 이불 바깥으로 삐져나온 나의 발을/ 가만히 잡고 있었던 것일까.' 「터치」부분. 이렇게 '내'가 다른 장소로 떠나는 건 그 장소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안이 이빨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입안이 이빨로 가득해서
나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구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배가 고파질 텐데.
우유가 마시고 싶어질 텐데.
「뮤트」부분
'내'가 기다리는 세계는 시저지와 같아서
<뮤트>는 시끄러운 소리를 죽일 때 나온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왜 시끄러울까. 주변의 소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주변의 소리에 비해 시끄럽다는 말이지, 뮤트 된 소리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고 할수 는 없다. 뮤트와 뮤트 아닌 음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는 입안이 이빨로 가득할 만큼 독기가 어려있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 독기는 이 장소에서 뱉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런가 하면 아주 이상한 분갈이를 보여준다. '영양사의 하얀 가운을 빌려 입고/ 하필 나는/ 뿌리가 살아 있는 머리카락을 화분에 심었다.// 거름도 주었다.'「분갈이」부분.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식물의 자리로 옮겨가고 싶다. 탁자의 모서리를 두드려 생각의 모서리로 이동한다. '나'는 뮤트되지 않는 말과, 식물의 몸이 아니어도 되는 얼굴을 갖고 싶다. 화자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건 마치 시저지와도 같아서, 마치 지구의 바깥에 존재하는 곳인 것 같아서 고작 이만한 그림자를 안고 있는 '나'의 힘으로는 가져올 수 없는 일 같다.
이곳을 만든 가장 오래된 신화를 부수고
그날의 도래를 화자는 어떻게 기다릴까. 우선 이곳을 만든 시간을 부순다. 제일 오래된 신화 하나를 망가트린다. 사악학 뱀이 이브와 아담을 부끄러움에 눈 뜨게 했다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쓴다. 뱀이 말한다. '아담의 갈비뼈를 모두 부러뜨려 종이봉투에 담'는다. 뱀은 '기합을 불어넣고', '심호흡'을 한다. '태권도 같은 것'을 한다. '-나라면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었을 거야.' 뱀이 말한다. 뱀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한 건 무엇이었을까.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이 없는 세상에 이브는 어떻게 있었을까. 이브로 말미암아 아담이 탄생하게 되었을까. 이 시의 제목은 「로맨스」이다.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그러나 시저지의 전말은 무엇보다 이 시에 있다. '기다림'을 설명하기에 이만한 문장은 없을 것이다. '마음이 탄다. 그러나 나의 맥박이/ 너의 심장에 맞춰 빨라질 수는 없다.// 면목이 없다. 그러나 너의 얼굴 위에/나의 이목구비를 그려 넣을 수는 없다.//우리는 성분이 다르니까//멋대로 바꿔치기를 할 수 없으니까//' 「exchange」부분. 기다림 끝에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보다 더 나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에게 네가 가려지고, 동시에 내가 너에게 가려지는 부분의 어둠을, 이제껏 보지 못한 색의 깊이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이 곳의 역사는 이 말의 뜻을 모른다. 다음 시에서는 이 역사를 아는 화자가 대답한다. '알아? 나는 여자인간이니까/ 생리를 한다.// 그렇지만 손에는/ 다른 종/다른 류의 피가 묻어 있기도 한다.' 「여자인간」부분. '나'는 기다린다. 아담과 이브의 신화를 다시 쓰고, 생리를 하는 여자인간에 대해서 쓰고, 이 공기에 제대로 있을 수 없는 인간을 그리면서, 태양과, 달과, 지구가 한 선에 서 있는 날을 기다린다. 태양에 달이 귀속되지 않고, 태양에 지구가 매달리지 않고, 태양은 이들을 거느리지 않고, 셋은 이 지구에서 저마다의 질량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무엇으로 바꿔지거나 속해질 수 없는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린다.
마지막으로 이 시집을 덮기 위해서는 「개의 자리」를 지나가야 한다.
검은 개가 똥을 먹었다.
검은 개의 혓바닥이 나의 영혼을 핥았다.
검은 개의 눈이 나를 피했다.
그것은 일종의
사랑이어서
나는 슬프고 더러웠다.
추문이 깊었다.
태어날 때부터 지닌 비밀을
개와 나눌 수는 없었다.
「개의 자리」 전문
눈을 가리고 만든 물건들 속에는
내 손이 섞여 있을거야
개의 눈을 생각한다. 존재의 다름으로 생겨나는 수치를 내가 가진 힘으로, 그래서 '억압'의 도구로 두지 않는 것이 '내'가 '개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작은 방법임을 슬프게 고백한다. 개가 될수는 없다. 오해하지 말기를. 당신에게 개가 되라는 말은 아니었다. 개의 눈을 슬프게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다. 이 시에서 다 나가기 위해 다른 시를 불러 온다. '그러니 내 옆의 의자에 앉아/ 너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으면 좋겠다.// 밤을 새워주었으면 좋겠다.// 눈을 가리고 만든 물건들 속에는// 내 손이 섞여 있을거야.// 눈을 가리고 그린 그림 속에서/ 나는 너를 더듬고 있을 거야. ' 「이렇게 앉은 자세」부분.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위해서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했다. '베껴 슨 이야기에 소리를 불어넣고/ 뜻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녹취록」부분. 남은 일은 이제 이것 뿐인 것 같다. 기다림의 자리에 수많은 '내'가 남아서 만드는 날들을 '기다린다'. 시저지를 발견했던 사람의 얼굴을 내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얼굴이 되어볼 수는 있을테다. 또 하나의 'syzygy'가 탄생하게 되면 서로 이름 몰랐던 얼굴들이 자신으로 모여 '나'를 이야기 하게 된다. 어떤 말도 뮤트되지 않는 진짜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아직 지구에서 작게 서 있다. 다행스럽게도, 기다림은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나'만은 동그랗게 그곳에 분명히 놓을 것을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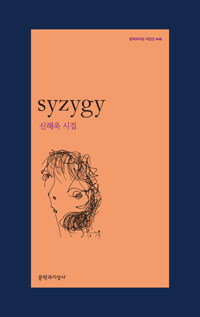
신해욱, 『syzygy』, 문학과지성사, 2014.
'이후의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실을 말하는 용기-<꿈의 제인>과 <담론과 진실> (0) | 2017.12.03 |
|---|---|
| 사라지는 일 (0) | 2017.11.27 |
| 나의 악몽이 저기서 잠들어 있다 (0) | 2017.10.31 |
| <대장 김창수>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땐뽀걸즈> (0) | 2017.10.23 |
| 다정함, 나약함, 슬픔을 다정함, 나약함, 슬픔으로 표현하는 일-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0) | 2017.10.10 |
- Total
- Today
- Yesterday
- 일상
-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
- 한강
- 1월의 산책
- 희지의 세계
- 이장욱
- 이준규
- 피터 판과 친구들
- 민구
- 뮤지컬
- 서해문집
- 문태준
- 상견니
- 현대문학
- 차가운 사탕들
- 정읍
- 배구
- 진은영
- 책리뷰
- 김소연
- 나는 사회인으로 산다
- 후마니타스
- 이문재
- 네모
- 궁리
- 이병률
- 열린책들
- 대만
- 이영주
- 지킬앤하이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